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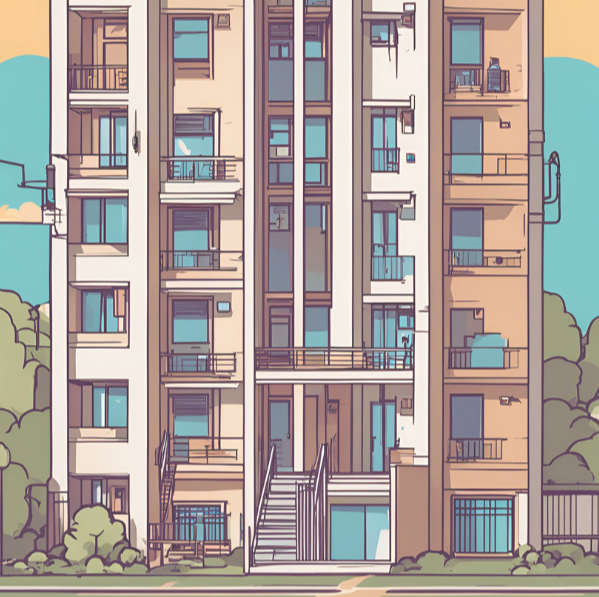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주거 공동체, 영역 표시, 동질감, 편리함, 그리고 환금성 등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같은 공간 구조.
층층이 쌓아올린 형태.
건축법상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파트와 사뭇 다른 개념이다.
아파트의 시작은 다분히 도시화로 인한 인구 밀집 그리고 주택 부족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최초의 아파트는 1930년 충정로의 유림아파트라니 놀랍다.
(아파트 이름은 검색하는 곳마다 다르다. 미쿠니, 충정아파트, 유림아파트..)
해방이후 최초 아파는 1959년 중앙산업이 지은 '종암아파트'이다.
이후 마포아파트, 동부이촌동 공무원아파트, 한강맨션아파트, 여의도시범아파트 등이 지어지면서
아파트는 주거문화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또 고급화ㆍ대형화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세한건 아래 기사에 정리가 잘 되어 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201547482290408
[건설로 읽는 현대사](11)서울 종암아파트-수세식화장실 본 이승만 '현대식' 감탄
www.dnews.co.kr
앞으로의 아파트는 어떻게 변화할까?
최근 지은 새 아파트는 내부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이 단지의 차별화를 불러온다.
헬스장, 독서실, 도서관, 수영장, 식당, 골프연습, 고층 카페라운..
이외에도 구조, 층고, 디지털 기술 연계, 공조기술 등 구조에 대한 쾌적함과 최신기술 도입 등이 약 10년전 아파트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특정 집단이 직접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의 녹지와 놀이시설, 건강과 취미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
이것은 개개인이 사회에서 모두 다루기 어려운 어떠한 복지 형태를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는 가운데 트랜드가 어떻게 변할까?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의 서비스와 비슷하게 식사제공, 정기적인 의료 회진, 운동, 취미 등 공동 활동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
또는 그런 서비스를 협업형태로 제공하는 아파트가 되지는 않을까?
초고급 형태의 시니어 주택은 이미 몇몇 있지만
소수의 특정 집단에 한하는 그런 형태 말고
보다 대중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생각의 한계는 특정 연령대가 몰려 있다는 것이다.
생산활동을 그만둔 연령대만 있다면 주거의 유지관리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연령대가 몰려있다는 것은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생각이 모이고 섞이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이 분명 있을텐데
오히려 보고 듣고 경험하는 폭이 극도로 좁아지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급속히 좁아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검색해보니 '세대공존형 주거단지'라는게 있다고 한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있겠지만 세세하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고
결국 공동체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계획된 공간설계로 가속 형성될 수도 있다.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앞으로의 아파트 트랜드는 사람들이 결국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가
어떤 생각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가
감당할 여력은 있는가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더 정리되고 관련 자료를 읽어 생각이 확장되면 다시 이 글을 다듬으러 와야겠다.